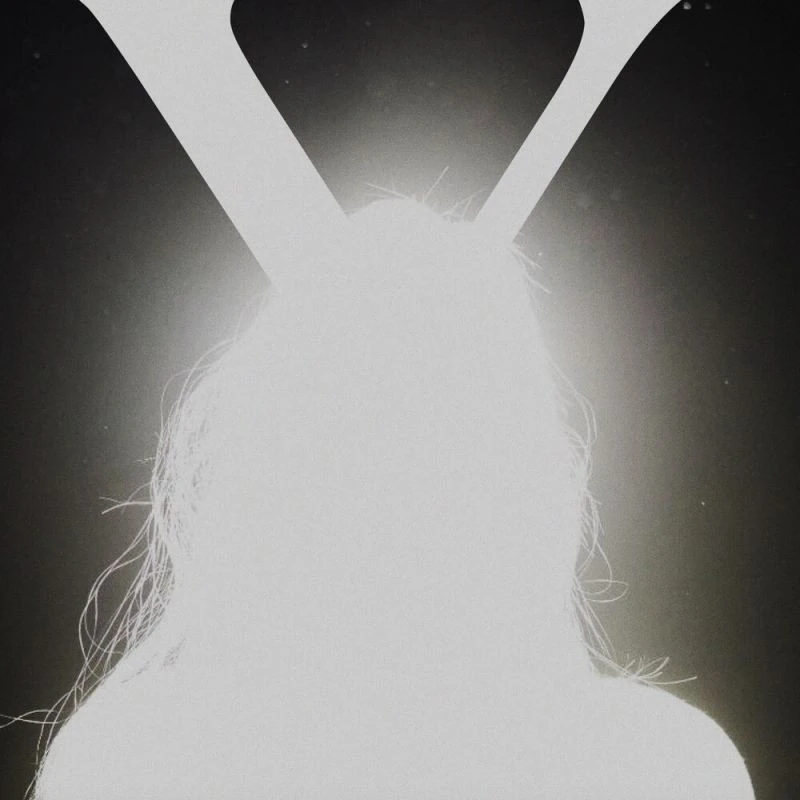
유라의 네 번째 미니 앨범 <A side>는 뒤집힌 수미상관이다. 그럼에도 2019년 미리 찾아온 <B side>와의 연결성은 깊지 않다. 다음 페이즈를 준비하는 ‘초기’ 유라의 마무리라 할까. 여전한 전위성과 생경한 언어가 순환하며, 꼭 처음 발표하던 그때의 미니 앨범처럼 4개의 트랙을 가졌다. 그중 가장 난해한 표현의 ‘시집’은 가사만큼 다채한 유라의 작가성을 반추한 채 드리운다. <B side>라는 뿌리에서 <A side>라는 꽃까지, 유라가 시나브로 그어온 나이테이자 소리골은 트랙 전면에서 정처 없이 맴돈다.
문단은 알 수 없는 형용으로 출발한다. “탁한 열대어에 동공처럼 축축한 인사를 해요”. “탁한 열대어”라는 개념이 도무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떻게 열대어가 탁할 수 있는가? 모호함은 노래로 낭독할 때 가늠된다. “에”의 발음을 혼동할 만한 “의”로 치환하자. “탁한 열대어의 동공처럼 축축한 인사”. 이쪽은 분명히 성립한다. 유라는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닌 들을 수 있는 문장을 쓴다. 작사가의 저작을 시가 아닌 가사로 부를 이유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사지에 적힌 “에”라는 조사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열대어의 동공이 탁하다면 생기를 잃은 것이다. 유라가 건넨 고별인사는 탁한 열대어‘의’ 동공처럼 축축하기도 하지만 탁한 열대어‘에’ 전해지는 것일 수 있다. 이 판단은 열려 있다. 유라의 시어는 중첩 상태를 지향하고, 그렇다면 어휘는 한 쪽이 존재하고 한 쪽이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의 조건이 아닌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테면 기호와 음성 간의 펀치 라인이다. (유라의 중첩적 화술을 떠올리면 다음 트랙명이 ‘슈뢰링가링가고양이’라는 점은 우연일 것 같으면서도 흥미롭다.) ‘미미’에서 “미미”가 형용사인 동시에 이름이었고 ‘하양’에서 “현관문 앞에 서성, 반짝”이라는 가사가 “현관문 앞에 서서, 반짝”으로도 들리듯 말이다.
그 후 “돌연” 찾아오는 상황은 “세상은 나를 짙은 남색으로 메워 심연과 키스”하게 하는 것이다. ‘시집’의 문단은 이렇듯 각기 단절된 시공간으로 이미지를 형성할 따름이다. “나와 네 숨은 서로를 쏘아보며 버둥거리는 브로치를 달고서 머뭇거리네”라고 할 때, 여기서 “브로치”란 일반적으로 떠올리기 쉬운 나비라던가 꽃 등의 형상을 하고 있게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브로치는 “버둥거”릴 존재이며 “숨”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시집’은 죽음 혹은 상실을 암시하는 “심연” 직전의 생이 헐떡이며 그것을 유보하는, 즉 “머뭇거리”는 사태에 있다.
상실은 유라의 오랜 주제였다. 관계를 노래할 때 유라의 이목은 헤어짐 이후에 쏠린다. 외투에서 불현듯 나타난 네가 줬던 쪽지(‘세탁소’)나 버려진 인형(‘유기인형’) 같은 사물이 줄곧 등장한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시집 속에 거친 잎을 포개어 후회의 찻잔에 덤으로 떠오른 부표들처럼”이라는 단상은 상실 이후를 상정한다. 또 이 직유는 선행한 상황에 대한 후첨인 동시에 뒤따르는 “나의 이야기는 몇 겹의 수레바퀴를 달았어”라는 문장에 선행한다. 다시 말해 ‘나와 네 숨이 서로를 쏘아보는 것’과 ‘브로치의 버둥거림’이 부표들처럼 행해지는 일이고, ‘나의 이야기가 몇 겹의 수레바퀴를 다는 일’이 부표처럼 행해지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문단의 이미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뿐 서로 다른 인상을 논하지 않아서다. 버둥거리는 브로치가 생의 상실처럼 나타나고 이야기에 달린 수레바퀴가 짐짝을 등에 진 채 지속하는 운동성(화자가 비관하는 삶, 시간의 지속)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찻잔에 떠오른 부표는 생명력을 잃은 낙엽이나 탁한 동공의 열대어를 호명한다. 이렇듯 ‘시집’의 어떤 문단은 다른 문단에 대해 상호보완적이다.
상실이 낭자한 생을 뒤로하고 “자유롭게 하염없이 날아” 향한 “모든 것이 아득한 내 세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천국”이다. 나, 나의 음악, 나의 노래, 나의 문자, 나의 시집이 그 천국의 스펙트럼 한복판에 있다. (“천국의 스펙트럼의 한복판에”가 아닌 “천국의 스펙트럼에 한복판에”라는 가사는 의미를 혼동하게 하나,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두 문장 간의 의미 전환이 확실하지 않고, 나열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렴이 끝나면 같은 형식의 구절이 조금의 변형을 가미해 반복된다. ‘탁한 열대어’와 ‘심연과의 키스’라는 이미지가 ‘벼락 틈새에서의 침묵의 식사’와 ‘서로의 망루 밭에 겨누는 고장 난 씨앗’으로 바뀌는데, 이미지가 품은 인상은 상실보다 폭력의 묘사로 변한다. 이 반복을 ‘허무한 허무함의 패턴’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인간과 현실의 어둠을 나열하는 언동은 천국이라는 환상을 통해 간편하지만 비합리적으로 맺어진다.
이를 두고 무책임이라 일갈할 수 있을까? ‘시집’이 만약 산문이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집’은 말 그대로 시다. 유라가 제시한 천국과 천국의 스펙트럼 한복판을 상기하자. 스펙트럼은 도구로 색깔에 따라 관찰한 빛이고 소위 무지개 빛이다. 빨주노초파남보 중 복판은 초록이고 다른 말로 “수풀 연못 색”이라 할 수 있다. 유라가 정규 앨범에서 ‘수풀 연못 색 치마’를 등장시킨 것은 “차임벨 소리마냥 상실을 누르고서”다. 상실은 여기서 조심스레 억눌린 뒷전이다. ‘적색의 체리 나무를 빈틈없이’ 먹는다거나 ‘미지근한 가지를 꺾는다’라는 생명력과 율동감이 넘치는 노래는 생명을 긍정한다. 상실 이후의 이후. 같은 음반 속 ‘동물원’의 “떠난 자국 위에는 무지개가 생길 거”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이 건네지는 “동물원 속에 갇힌 친구”. 그것은 유라가 펼쳐 놨던 상실과 폭력이라는 창살에 둘러싸인 우리의 모습 같다. 유라는 동물원을 탈출하는 광경을 그리며 무지개를 낙관하지만, 우리가 삶의 창살을 벗어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가끔 창살을 천진난만하게도 뛰쳐나온다. 그것은 서글픈 알앤비에서 015B의 원숙미, 재즈 밴드 만동과의 전위적 시너지, 추상적 가사를 경유해 다시 자신의 첫 미니 앨범을 지시하는 <A side>와 ‘시집’ 속 우뚝 선 유라의 고귀한 작가성이고 그 속에 깃든 제각각의 아름다운 음악들이다. 소리에는 프레임이 없다. 무한에 가까운 중첩과 <A side> 마지막 트랙 ‘어떤 발라드’의 소절처럼 위로 삼아 무너지고픈 “어떤 이별”이 있을 뿐이다. 다른 누군가의 상실 고백이 자아낸 유대감은 나의 상실에 하한처럼 작용한다. 감내는 나의 몫이지만 이 필연의 체험은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라의 음악을 더러 보증처럼 삼고 무너진다. <B side>에서 <A side>로 변천한 유라의 자취처럼 다시 튀어 오르기를 고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