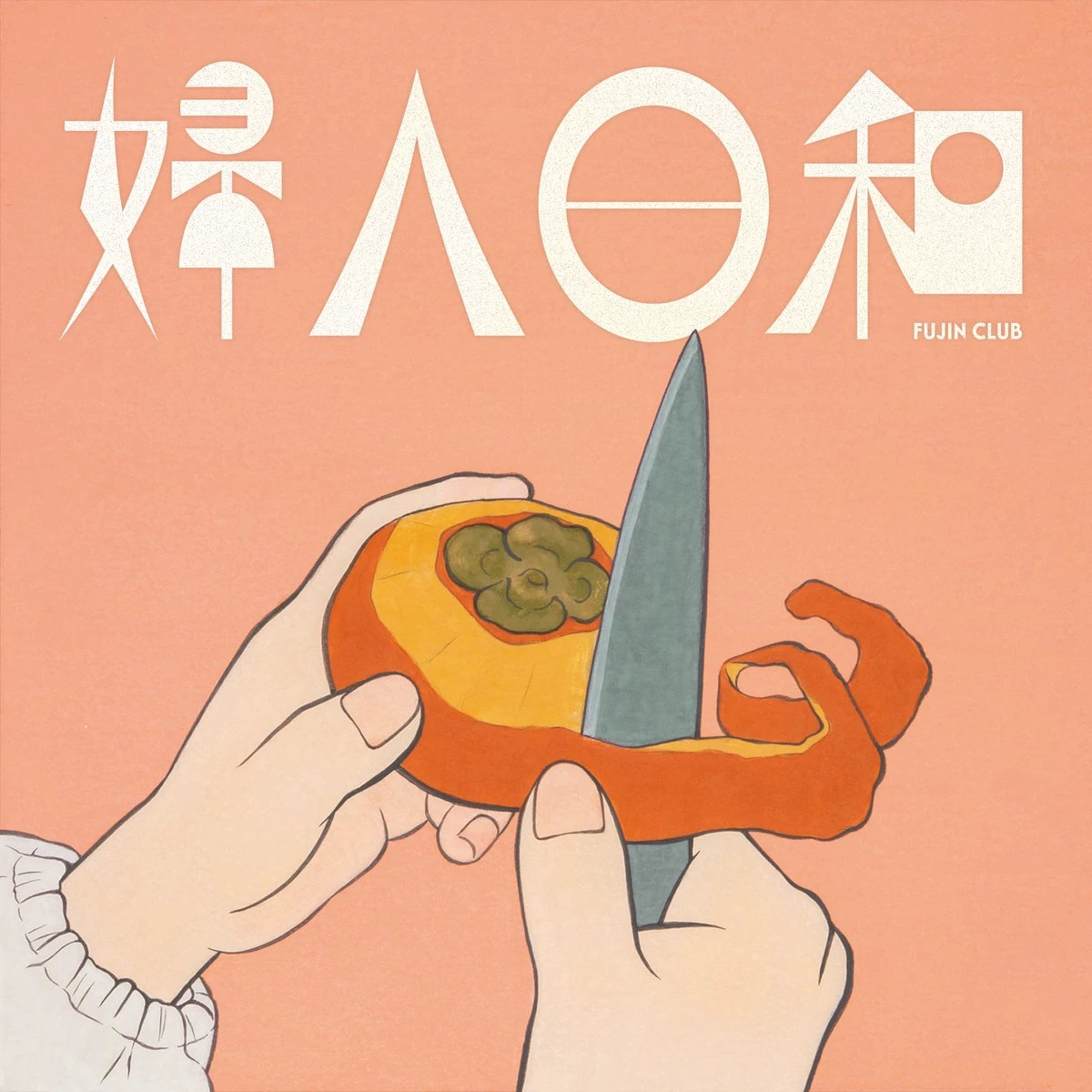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다. 나는 그것을 할머니의 나이를 역산해서 사실로써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일본 여행을 떠나기 전, 할머니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당신도 일본말을 할 줄 안다고 하시곤 학교에서 배우셨던 문장과 노래(기미가요)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그 순간부터 내게 일제강점기는 더 이상 지나간 사실이 아니게 됐다.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는 ‘사도섬의 금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렸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자행됐던 곳으로, 군함도(하시마섬)와 같은 아픔이 있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해 왔으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제성’에 대한 명시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등재에 찬성해 버리는 바람에 등재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가올 11월 21일에 개최될 사도광산 추도식은 이런 사정으로 인해 2년 연속 공동 개최가 무산됐다. 이미 군함도 등재 이후 강제 노역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도 미흡했다며 한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2025년 11월 5일, 9년 만에 발매된 부인클럽(婦人倶楽部)의 2번째 정규 앨범이 불쾌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인클럽은 사도섬으로 이주한 프로듀서 사토 노조무(佐藤望, M. Lemon)가 2014년 섬에 거주하는 4명의 주부를 모아 결성한 그룹이다. 이들이 다루는 주제는 섬사람/주부로서의 일상이다. 외출하고, 밭을 매고, 정월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소소한 일상으로 가득하다. 단지 이들이 사는 곳에 사도광산이 있고 마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광산을 찾아오라고 말할 뿐이다.
2020년 발매된 싱글이자 본 앨범 수록곡인 ‘네게 부드러움을’(君にやわらぎ)은 광산을 홍보하며 섬의 풍요를 바라고 있다. 이 어디에도 강제 노역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관광지를 홍보한다는 노래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누가 홍보 문구에 ‘우리 섬의 광산은 20세기에 1200여 명의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일어났던 곳입니다’라고 쓸까. 만약 스스로 용기와 책임 의식을 갖고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일이다. 그렇지만 평온이나 부드러움 따위를 뜻하는 단어(やわらぎ)를 제목에 넣고, 다른 발표곡처럼 시부야케이를 기반으로 해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건 또 어떨까. 그건 사도광산에서 벌어졌던 타국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그 위에 마을을 다시 짓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일이다. 2020년에 발표된 이 곡은 201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 니가타 현과 사도 시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테고, 그 흐름에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어떠한 주석도 없이 그저 ‘좋은 관광지’라고만 소개하고 있다. 사도광산을 소개할 때는 항상 꼬리표가 달려 있어야 한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감독 조너선 글레이저는 오스카 시상식 소감에서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하며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목했다. 그에게 있어 홀로코스트란 과거 유대인이 학살당했다는 역사적 사실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화’다. 이번에 부인클럽이 그린 평범한 일상, 평범한 노래 속에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악(惡)이 자리 잡고 있다. 평범한 관광지처럼 소개하는 사도의 금산 갱도 너머에서는 끔찍한 소리가 그치질 않는데, 광산의 역사를 가사에 녹였다는 해설 글 어디에서도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부인클럽은 적극적으로 역사를 은폐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