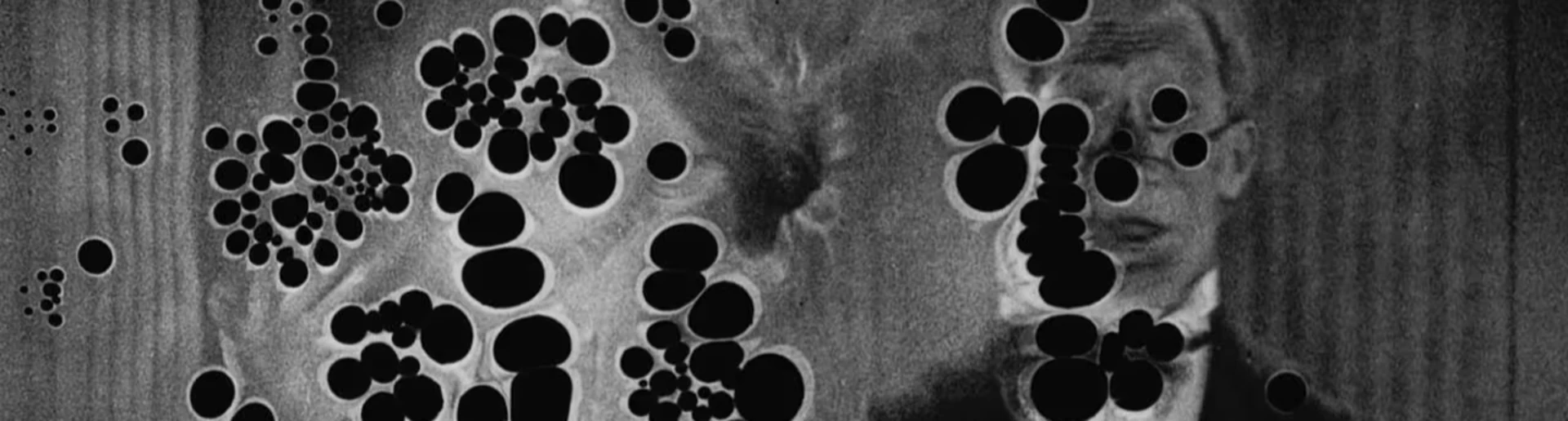 Bill Morrison, <Decasia> (2002)
Bill Morrison, <Decasia> (2002)
디지털카메라의 투박함과 필름 그레인, 바이닐과 테이프를 구현하기 위한 저음질 연출을 담당한 노이즈는 과거의 음향적 시제가 되었다. 하지만 전자음을 등장시킨 기술 발전은 본래 제거 대상인 그것을 멸종 위기로 밀어 넣었다. 다만 이는 순전히 작곡의 결단에 국한한 이야기다. 스튜디오를 벗어나면 작금의 세대는 스스로를 규명할 노이즈의 상실을 맞았다. 바이닐 세대, 라디오 세대, 테이프 세대, MTV 세대 등등,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신의 시절을 돌이킬 것인가? 가령 ‘무손실’이나 스트리밍을 추억하는 노이즈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당장 현재가 취하는 방편 중 하나로 20세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당대 음악을 열렬히 청취하는 대과거적 현상은 딱히 당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흥행했다거나 명곡은 시대 불문이라는 촌평에 기인하지 않는다. 21세기의 회상이 20세기의 회상에게 매개라는 대목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이는 사이먼 레이놀즈가 지적한 대로 과거에 비해 음악이 포화 상태로 접어든 것이 청자의 정복욕을 좌절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큐레이션’이라는 키워드의 관심도는 지난 20년간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인다.) 기술의 정확함과 편의성은 기술적 진보가 곧 사회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조지 오웰의 <1984>의 예견과 발맞춰 문명은 통제를 통제로 인식할 수 없도록 세계를 설득했다. 문명 체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거나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기류다. 덕분에 꾸준히 갱신되어야 할 과거는 21세기에 그만 퍼져버렸고, 전에 물질이었던 음악의 청취 단위는 음원이라는 비물질을 맞닥뜨려 얼어붙었다.
여기서 그친다면 노스탤지어의 상실은 오히려 즐거운 일일지 모른다. 음악에서 노이즈란 늘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며, 더 이상 매체의 물리적 한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형적 시간상에서 과거지향은 현재와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 세대가 디지털 음원의 CD보다도 바이닐을 주목하는 요인 중 하나로도 분명 아날로그와 노이즈가 지닌 시대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흐르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2020년대와 2030년대가 추억하게 되는 시간의 지점은 길어지는 시차에도 유사할 것이며, 현대는 과거를 골고루 회상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 이하를 돌이킨다. 즉, 1980년대를 향한다고 했을 때, 2020년대는 40년을, 2030년대는 50년을, 2040년대는 60년 어치의 리마인더를 상실한다.
추억의 촉각을 잃은 채 점차 과거를 토대로 한 사고를 망각하고 저마다 다른 대과거로 천착하는 탓에 현대는 동세대임에도 동시대적 자아 구축에 실패한다. 젊은 세대에게 뉴스는 더 이상 세상의 절대적 창구로 기능하지 않는다. 과거의 상실이 현재의 상실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문화가 성행하는 일본의 투표율이 항상 농담처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꼭 우연일까?) 같은 대목에서 음악 내적 상황을 검토해도 마찬가지다. 노이즈를 활용하며 나타난 음악들 중 Lo-Fi는 노스탤지어를 동반한다기보다 노이즈를 텍스처로 녹여내며, 재패노이즈는 형식이라 간주되던 노이즈를 대상이자 내용으로 삼는다. 노이즈가 점차 형식의 선상에서 돌출하여 다른 맥락에 침범되고, 갈 곳 잃은 노스탤지어 역시 노이즈에 발맞춰 따른다. Lo-Fi 사운드를 강력히 추구하던 시절을 지나 현재 주류 레트로 음악은 잡음보다도 옛 장르의 문법을 품어오는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동시에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처럼 이미 과거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음악을 다시 차용하는 형태의 ‘복고에 대한 복고’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무손실’을 추억하는 노이즈의 정체는 밝히기 까다롭다. 현대는 이미 노이즈의 정의를 어느 정도 희롱하고 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의 노이즈와 가능한 때의 노이즈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과거를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대에 와있는 사람들 간의 간극이다. 질문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노이즈로 삼고, 어떤 소리를 캔슬하며, 누가 그것을 도려낼 힘을 갖는지 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무력을 이끈 노이즈의 상실은 이렇게 보고 나면 시스템의 농단처럼 느껴진다. 이로 인해 미래를 향한 야욕과 엔트로피적 과잉 증가의 원체 드물었던 제동마저 풀려나간다. 복고의 과거지향은 미래지향을 방임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로 기술의 완연함과 시스템의 완연함, 그리고 정보의 과다와 단절의 깊이는 서로서로의 인과를 마구잡이로 자처하며 뒤섞인다. 노이즈를 잃은 세계는 자체로 노이즈다.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증폭 현상 아래, 이어폰을 꽂고 출근해서,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고, 키오스크로 점심 메뉴를 주문하며,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어폰을 꽂고 퇴근하는 것으로, 염치없이 디스토션의 임박을 외면한다. 편리함과 빠름을 사로잡은 기술은 거부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이 중독적 양상으로 전개되며 기계화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조차 이러한 정치 역학보다 종말론을 향한다. 하지만 기술 문명이 딱히 비정치적인 것은 아니며 외려 그것은 탈정치의 기제이자 역사 접근성의 퇴화라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완벽 방음을 내세운 외제차와 차량 제조공장 노동자의 청력 상실, 브라운관 티비로 장식한 카페와 부식된 간판의 전파사, 청소기가 작동하기 전까지만 더께가 쌓일 수 있는 추억 서린 것들. 이 글을 추동한 질문이 노이즈와 세계의 연관을 묻는 것이라면 대답은 소음의 차단과 함께 비관으로 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