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탈영토화된 구역,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해로운 하나의 비장소”- 마크 피셔, <유령론이란 무엇인가 >*
근래 음악은 타 예술이 골치를 앓는 해적을 박멸하는 데 성공했다. 복잡한 중개를 거쳐 감상하는 영화나 미술에 반해 음악은 스트리밍 시대를 열어 거의 모든 청취 경로를 적법하게 했다. 많은 음악을 신속하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감상할 수 있기에 거절할 이유가 하등 없다. 바야흐로 스트리밍 시대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4년 10월 5개 주요 음원 스트리밍 어플(유튜브뮤직/멜론/지니뮤직/플로/스포티파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00만 명을 초월한다. 유료 구독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식 음원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유튜브에서 약간의 기능 제한만을 둔 채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영상을 수두룩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제 피지컬 앨범은 소장품으로 전락했다. 물론 스트리밍 시대가 업계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형국을 뜻하진 않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량의 음원을 확보해 두어야 경쟁력을 얻기에 소수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해서 아티스트들은 작품을 소수의 플랫폼에 집약적으로 업로드하고 저마다 선택을 기다린다. 의외로 아티스트의 역할은 소비 형태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업로드의 주체가 아티스트가 아니라 기업이라면 어떨까? 실제로 K-POP 산업은 스트리밍 시대에 빨라진 소비 주기에 맞춰 창작 주기를 조절했다. 앨범에서 미니앨범, 미니앨범에서 싱글로 체급을 낮추고 촘촘히 발매했다. 음원을 발표하고 수익을 거두는 주체가 아티스트 본인이 아닌 기획사라는 점에서 산하 여러 아티스트의 활동 일정을 시기와 소비층에 맞게 분배했다. 그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금에 의한 마케팅은 그들 앞에 음악을 순식간에 쉴 틈 없이 가져다 놓는다.
기업이 능한 것은 속도전뿐이 아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체계적으로 소비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개별 구매와 달리 정액제는 단일 작품을 소비할 때마다 선택에 신중할 이유가 없다. 감수할 기회비용이 턱없이 적어서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연이어 추천되는 음악을 무상하게 듣는다. 이때 득세하는 것은 세간에 많은 노출량을 과시한 흩뿌려진 유행가다. 우리는 이를 더러 ‘개인형 맞춤 정보’라 하지만 이는 ‘개인’이 완성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개인의 음악적 소양과 취향은 무한히 변형될 여지가 있음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다.
얼핏 무난한 창구로 보이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주류 음악과 비주류 음악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지대가 아니다. 캐나다의 1인 밴드 신디 리(Cindy Lee)가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힙나고직 사운드의 앨범 <Diamond Jubilee>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업로드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결단을 내린 것은 이에 기인한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 역시 스트리밍 시스템에 반하는 성질이다. 국내에선 유물이 된 바이닐 시장에 인디 계열 아티스트는 여전히 신상을 내어놓는다. 음악 청취에 능동적인 (혹은 그렇게 보이고 싶은) 소비자는 앨범과의 아날로그적 연대를 끊지 못했다. 그들은 듣고자 하는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바이닐 더미를 뒤질 수도 있고 스트리밍 플랫폼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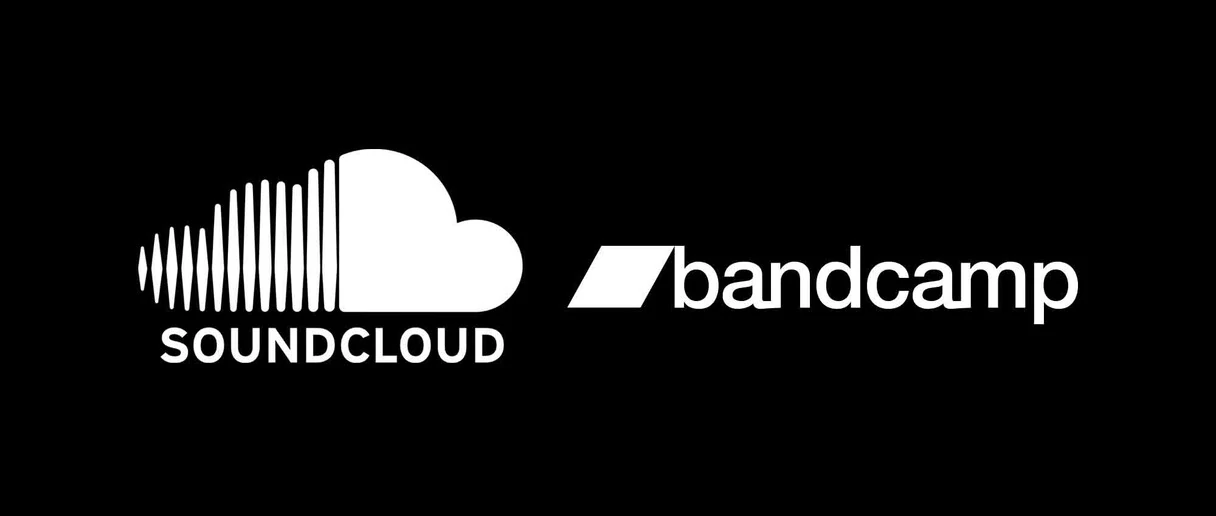
그리하여 스트리밍 계에도 그들을 위한 신대륙이 있다.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나 밴드캠프(bandcamp)는 주요 플랫폼과 달리 특별한 유통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음원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공식 음원이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보유량과 서비스 등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양상을 띠고 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 없이 음원을 공유할 수 있어 사운드클라우드는 전자음악/힙합, 밴드캠프는 그 이름처럼 록의 등용문으로 기능했다. 일례로 2010년대엔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출세한 XXXTENTACION의 ‘Look At Me!’를 위시한 일련의 힙합을 ‘사운드클라우드 랩’이라 엮어 일컫기도 했다. 로파이(Lo-Fi), 멈블 등 아마추어리즘 특성을 위주로 이들의 음악은 파악됐으며 향후 힙합 씬의 향방에 어느 정도 변곡점을 가했다고 여겨진다.
사운드클라우드 내에서만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도 있어 몇몇 사용자들은 자신만 알고 있기 아깝다는 무명 사운드클라우드 아티스트를 커뮤니티 상에서 종종 공유한다.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유료화하여 음악으로 돈벌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소득 방식은 메인스트림의 관점에선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말 그대로 속세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자다. 하지만 사운드클라우드 내에서 활동하면서도 그러기를 원치 않는 이도 물론 존재한다. 그들은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그러길 원치 않는다. 자신의 음악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밴드캠프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원을 유료화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작곡이란 순전히 취미활동이 된다. 그의 작곡과 음원 발표는 여타 음원과 다를 바 없이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수익을 창출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음악가?) 물론 유료화한다고 사정이 급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아마추어 아티스트에 머무는 연유는 수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때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음악이 널리 퍼지기를 도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상 직접적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시장 안의 음원은 급격한 속도로 생산되고 동시대의 음원뿐 아니라 이제까지 존재한 모든 음원과 경쟁한다. 엄청난 음원의 풀에서 청취자는 수많은 플랫폼 곳곳에 어떤 음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러니 알고리즘은 뒤가 구리다는 걸 알면서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보호비를 받는 마피아’의 자태로 우리 곁에 있다. 아니라면 우리는 시스템이 선사하지 않는 만큼의 노동을 (디깅, Digging) 감수하고 이름 없는 음악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 노동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마추어와 프로의 공급 방식의 무분별로 가시화되어 있다. 우리가 한 노래를 다 듣고 나면 비슷한 곡은 배로 늘어나 있다. 따라잡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정보는 개미지옥의 형태다. 모래는 딛고 올라서려 할 때 흩어지고 만다.
사운드클라우드의 출현은 본뜻 그대로 ‘나만 아는 가수’의 출현이다. 다들 그런 가수를 하나쯤 염원하듯 굴다가도 정작 출현하자마자 꽁무니를 뺀다. ‘나만 아는’ 것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음을 공유하지 않음이고 또 내가 알고 있음을 증언해 줄 이가 없음이다. 여기서 인정욕구가 음흉하게 싹튼다. 어차피 정복할 수 없는 음악적 정보를 파헤치는 것은 무보수의 노동이다. 평범하게 듣기 좋은 음악이란 어느 계층에나 존재한다. 그러니 마치 반(反) 문화에 심취한 겉치레를 한 힙스터도 결국 힙스터의 아이돌을 지닌다. 인디 음악에서도 스타시스템은 유효하다. 예술과 자본의 부정교합은 에어팟과 바이닐이 동시에 유행일 수 있는 진풍경을 자아내고 진짜 비주류의 세계를 폐기처분하기에 이른다. 현대의 인디는 본의의 인디가 아니고 사운드클라우드는 그보다 아래층에 위치하는 무언가다. 그렇다면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아무도 모를 음악을 만들고 찾으며 헤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오르지 못할 사구를 끊임없이 짚어대는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미련한 사람일까? 아웃사이더일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도 아니면, 위용을 떨치는 시스템의 매립지에 묻힌 채 누구도 존재를 증언할 수 없게 된 소위 ‘유령’은 아닐까?